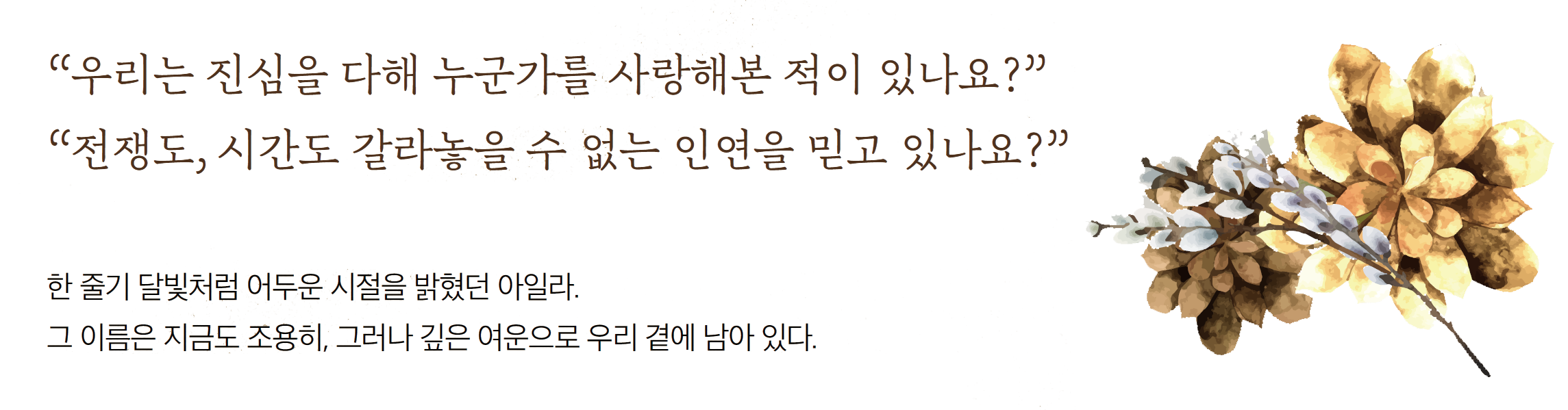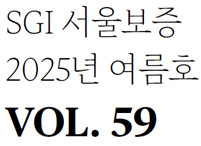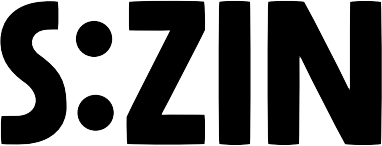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
전쟁이 남긴 눈부신
가족의 이야기, 아일라
글. 편집실
전쟁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
1950년 6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즉각적인 지원을 결의했고, 지구 반대편의 나라 터키도 이에 응답했다. 5,000명이 넘는 터키군이 머나먼 나라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 슐레이만 딜비를리(Süleyman Dilbirliği) 하사는 전장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만남을 하게 된다.
추운 겨울날, 전투 임무 중이던 그는 폐허가 된 마을 한켠에서 홀로 떨고 있는 다섯 살 소녀를 발견했다. 먼지투성이에 얼굴은 얼어 있었고, 눈빛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부모를 전쟁통에 잃고, 말도 잃은 채 온몸으로 두려움을 견디고 있었다. 슐레이만은 그런 아이를 차마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소녀를 자신의 부대 내로 데려왔고, 먹을 것을 나누고 담요를 덮어주며 진심으로돌 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에게 ‘아일라(Ayla)’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터키어로 ‘달빛’이라는 뜻이다. 포화 속에서도 아이의 눈동자는 유난히 맑고 밝았기에, 그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언어도, 국적도, 문화도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가족 이상의 애정이 자라기 시작했다. 아일라는 슐레이만 곁에서 점점 웃음을 되찾았고, 그의 무릎에 앉아 장난을 치며 아빠를 대신할 존재로 의지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고통 속에서도 두 사람은 작은 평화를 품은 하나의 가족이었다.
원치 않았던 이별과 긴 기다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냉혹한 현실이 두 사람 앞에 서게 되었다. 슐레이만은 터키군 철수 명령을 받았고, 규정상 전쟁 고아였던 아일라를 함께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는 수차례 그녀의 입양이나 이송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일라 역시 상황을 직감한 듯 눈물로 그를 붙잡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포옹 속에 이별할 수밖에 없었다.
슐레이만은 아일라를 한국의 고아원에 맡긴 뒤, 마음의 한 조각을 떼어놓은 채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후 결혼해 가족을 꾸렸지만, 평생 가슴 한켠에는 아일라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한국에서 머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선명하고 깊은 시간이기도 했다. 매년 한국전쟁 발발일이 다가오면 그는 달빛을 보며 아일라를 떠올렸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반면, 아일라는 슐레이만을 잃은 뒤 고아원에서 성장하며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그녀 역시 기억 속에 자리한 따뜻한 품을 잊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나눈 사랑, 이름 없이 불렀던 ‘아버지’라는 단어.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60년이 흐른 2010년. 터키와 한국의 방송사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 프로젝트를 통해 두 사람의 행방을 추적하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감동의 재회 현장. 서로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전에, 눈물부터 터졌다. 어린 시절 그 따뜻한 품을 기억하고 있던 아일라와,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은 적 없던 슐레이만.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되었다.
달빛 아래 다시 만난 이름
아일라와 슐레이만의 재회는 단순한 개인적 감동을 넘어, 국경과 언어, 세월조차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과 연대의 이야기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 실화는 터키 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었고, 결국 2017년 터키에서 영화
이 영화는 단순한 전쟁 영화가 아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다운 온기와 사랑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작품이다. 영화 속 슐레이만은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일라는 단지 전쟁 고아가 아니라, 누군가의 품 안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지금도 아일라와 슐레이만의 이야기는 한국과 터키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실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