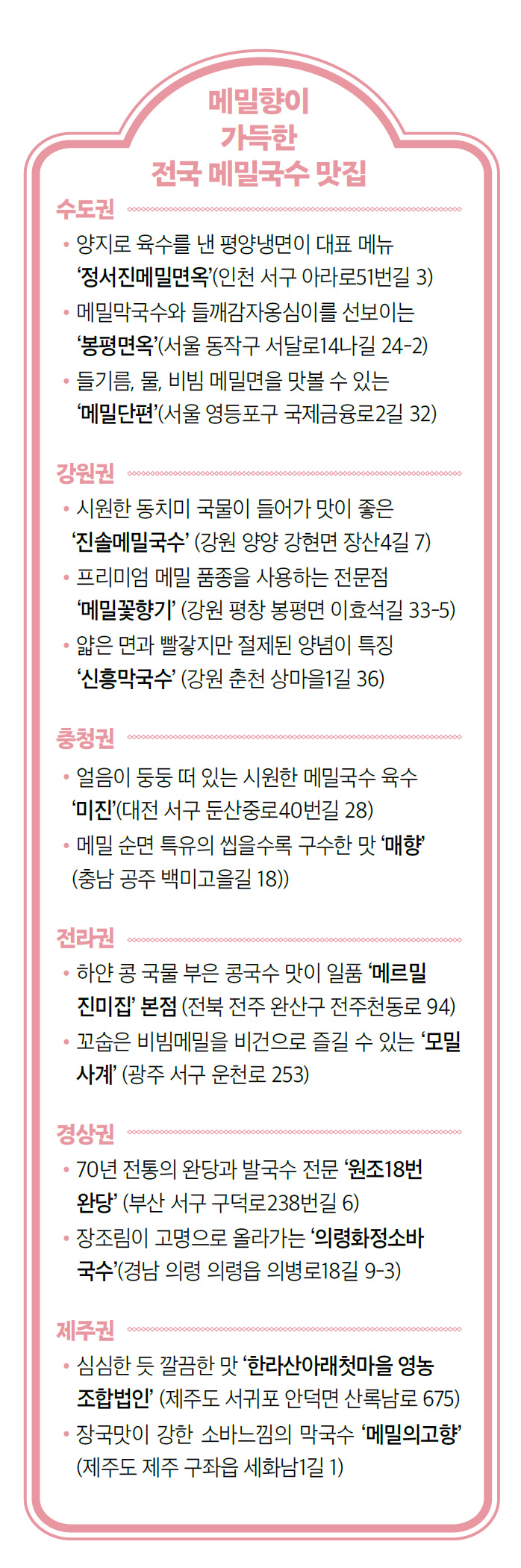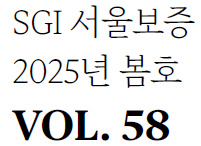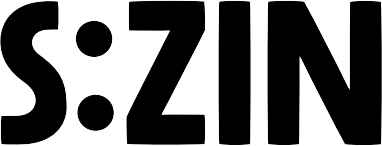서민의 삶을 지탱한 한 그릇, 메밀
메밀은 대표적인 구황작물이다. 구황작물은 불순한 기상조건, 척박한 환경에서도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 흉년이 들 때 큰 도움이 되는 작물을 뜻한다. 재배하기 쉬운 메밀은 서민들이 널리먹은 음식 재료 중 하나였다. 메밀로 만든 음식 중엔 특히 메밀국수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음식디미방’, ‘주방문’ 같은 조선시대 조리서를 보면 메밀국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그냥 ‘면(麵)’이라 불렀다. 그만큼 메밀국수가 널리 먹던 음식임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조선주재 미 공사관 해군 무관으로 근무했던 ‘조지 클레이턴 포크’에 대한 기록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있다. 포크는 민영익이 보빙사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담당했던 인물인데, 조선에 발령을 받은 뒤 전주에 들려 식사한 것에 대해 메모를 남겼다. 이 메모를 보면 메뉴에 ‘베르미첼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베르미첼리는 이탈리아 파스타의 일종이다. 당연히 1800년대에 전주에서 파스타를 내왔을 리는 없다. 이는 국수에 대한 묘사인 것이다. 당시엔 메밀면에 여러 가지 채소와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편육, 기름장, 간장을 넣어 비벼 먹는 골동면이란 음식이 있었는데, 포크 역시 이 요리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밀국수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조선의 대표 음식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메밀꽃 피는 강원, 메밀밥 짓는 제주
메밀로 유명한 지역은 강원도다. 강원도는 산지가 많고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농작물 재배가 어려웠다. 그래서 옛부터 메밀이 흔했다. 소설가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 꽃필 무렵>의 배경 역시 강원도 평창이다. 제주도 역시 메밀로 유명하다. 통계청의 ‘농작물생산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메밀 생산량은 총 2,705톤었다. 이 중 제주도가 974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972톤이었다. 그 다음이 175톤의 강원도였다. 즉, 제주도는 강원도보다 5배 이상 메밀을 많이 생산했다. 제주도 역시 땅이 척박했기에 메밀의 역사가 깊다. 예로부터 벼가 생산되지 않았던 화산섬 제주의 유일한 식량은 보리와 메밀이었다. 제주도에선 “아이를 낳으면 메밀로 만든 수제비인 메밀 조베기를 먹고, 사람이 죽으면 메밀로 만든 떡인 돌래떡을 넣어 장례를 치른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메밀은 제주도 사람들에겐 생사를 함께해 온 음식이었다. 좋은 메밀의 기준은 뭘까? 메밀도 쌀과 같이 막 수확한 것들이 맛이 좋다. 햇메밀이 나오는 늦가을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옛부터 메밀국수가 겨울음식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